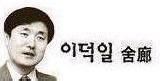운현궁에 대해 알아봅니다.![]()
운현궁(雲峴宮) | ||||||||
| ||||||||
서울시 사적 제257호로서 종로구 운니동에 위치한다. 운현궁은 26대 고종의 잠저(潛邸)이며 흥선대원군의 사저이다. 5궁중에 임란 때 소실되지 않은 유일한 궁중이다. <운현궁의 봄>은 1933년 김동인이 쓴 역사소설이다. 흥선대원군의 일생과 조선말의 복잡한 내외정세 및 지배계급의 억압과 착취로 고통 받는 민중에 대한 연민을 적은 내용이다. 궁궐은 아니었으나 궁궐보다 더 큰 위세를 누렸던 집이다. 운현(雲峴)이란 서운관(書雲觀) 앞에 있는 고개인데 이곳에 집을 지어 1852년에 고종이 태어나서 12세까지 살았다. 이 사저를 운현궁으로 부르게 된 것은 1863년 12월 9일 이명복(고종, 14세)이 이곳에서 민자영(명성황후, 16세)과 가례를 치러 운현궁이라 불렸다. 조선 왕조 27명 중에 적장자로 왕위로 계승된 분은 7명밖에 없다. 철종이 후사가 없어 6촌 고종(본명 이명복)이 왕위에 오르니, 왕의 생부인 이하응이 대원군의 위치를 굳혀 권세를 누렸다. 그는 외척을 근절하고 왕권 강화를 위해, 친척이 없는 무남독녀인 민자영(민비)을 간택해 자부로 삼았다. 명성황후(민자영)의 고향은 경기도 여주이며, 장악원 첨정 민치록의 외동딸이다. 일찍 부모를 잃고, 삼촌 민승호(대원군 이하응의 처남)의 집에서 자랐다. 왕비가 된 그는 점차 정권욕이 생겨 민씨 성을 가진 친척을 규합해 대원군 정권에 맞섰다. 황헌의 <매천야록>에 ‘터를 다시 넓혀 주위의 담장이 수리(數里)나 됐고, 네 개의 대문도 설치해 대내(大內)처럼 엄숙하게 했다’고 하니 그 규모와 화려함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잠저가 있는 조선 국왕이 많다는 사실은 그만큼 조선 정치사가 파란이 많았음을 뜻한다. 태조 이성계를 비롯해 정종·태종·세종·세조·성종·중종·명종·선조·광해군·인조·효종·영조·철종·고종 등 15명으로서 27임금 중 절반이 훌쩍 넘는다. 잠저에 있다가 대통을 이으면 잠저를 본궁(本宮)으로 삼는데 태조는 고향인 함흥본궁(咸興本宮)과 개성의 경덕궁(敬德宮)이 있다. 어의궁(於義宮)은 인조와 효종의 잠저인데, 종로구 사직동의 상어의궁(上於義宮)과 나중 효종이 이주한 종로구 효제동의 하어의궁(下於義宮)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선조의 잠저도 사직동이라고 전하니 사직동이 왕기(王氣) 서린 지역인 셈이다. 영조는 즉위 후 '검암발참기(黔巖撥站記)'라는 글을 사관(史官)에게 넘겨준다. 연잉군(延礽君·영조)이 경종 1년(1721) 8월 15일 부왕 숙종의 탄일에 명릉(明陵)을 배알하고 돌아오는데 소도둑이 지나갔다. 연잉군은 검암(黔巖) 발참장(撥站將) 이성신(李聖臣)에게, "흉년에 배고파 그랬을 것이니 소는 주인에게 돌려주고 도둑은 관가에 고하지 말라"고 명했다. ☞ mulim1672님의 추천 포스트 | ||||||||
'문화, 문화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17년 정유년(丁酉年) (0) | 2016.12.25 |
|---|---|
| 옛 지명 갑비고차(甲比古次)인 강화도(江華島) (0) | 2016.10.06 |
| 강화나들길 (0) | 2016.08.15 |
| 2016 창덕궁 달빛기행 (0) | 2016.08.09 |
| 담양 소쇄원 & 식영정 (0) | 2016.07.31 |